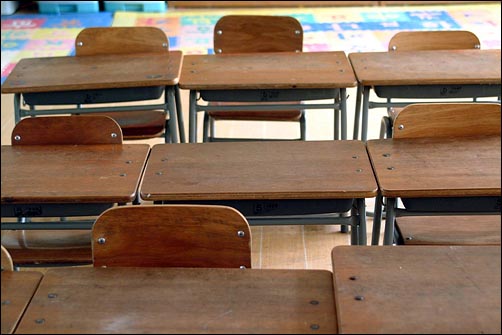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728x90
| ||||||||||||||||||||||||
나는 십리가 넘는 학교까지 책보를 메고 터벅터벅 걸어 다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봄 내내 하얀 손수건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다니며 개나리 담장 아래 병아리처럼 조잘대곤 했습니다. 처음으로 얼굴 가득 내려앉는 햇살을 느꼈고 또 그 뒤로 생겨난 내 그림자를 처음 보았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아 아침나절에는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작은 차돌을 화롯불에 구워 따끈하게 데워진 돌을 주머니에 넣어 주셨습니다. 손이 시려우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멩이를 만지작만지작 거리며 학교를 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년시절의 그림입니다.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들고 다녔던 자연실험 주머니 속에 들어서 있던 단추며 자석이며 나무토막, 조개껍질도 모두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자연시간에 배운 아지랑이가 운동장 저 너머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걸 발견했을 때는 마술 상자 속에서 비둘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처럼 아! 하고 탄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봄날엔 모든 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신비롭게만 느껴졌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은 음악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풍금소리가 좋았습니다. 풍금소리를 내려면 발로 페달을 밟아 주어야 하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음악시간에 선생님이 풍금으로 반주를 하시면 아이들은 입이 찢어져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쩌다 선생님의 눈이라도 마주치면 제비 새끼가 어미제비에게 먹이를 받아먹듯 입을 크게 벌리던 아이… 또 두 뺨이 복사꽃처럼 되어 살그머니 시선을 책상으로 떨구어 수줍게 노래 부르던 아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부족하게 먹은 점심밥 때문에 뱃속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했던 시간은 아침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의 훈시가 제일 지루하고 재미없었습니다. 이미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왔는데 전교생을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맥 빠지는 아침조회를 해야 하는 것이었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조회시간에 얼마나 졸리던지 눈꺼풀이 자동으로 내려오는데 졸음을 내쫓으려고 눈에 침을 발랐습니다.
언젠가 학교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작로 길바닥 모퉁이에 책보를 내려놓고 흙장난을 하다가 책보를 건드려 책보가 데굴데굴 굴러 강에 빠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비탈로 굴러 책보를 낚아챘습니다. 하마 트라면 강물에 빠질 뻔 했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책보가 강물에 빠지면 나는 학교에 다닐 수 없을 거야?’하는 생각이 퍼뜩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 저 멀리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면 내 발길은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어린 동생들은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늘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젠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주 가끔은 허전해 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또 다시 되돌아 갈 수 없는 유년의 그리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름이 되어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기를 잊어 버렸듯이 또 그렇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감정 하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생기 있게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세상에 대한 온갖 호기심과 질문을 가진 아이의 마음처럼 무엇이든 신비롭게 느끼는 감정에서부터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어떤 것에 신비를 느끼지 않게 된 사람은 눈을 감고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온갖 생명체가 그 신비스런 소생을 보여 주는 계절, 봄의 생기로, 그 봄 햇살 속에서 문득 신비로움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새봄을 맞이했으면 싶습니다. | ||||||||||||||||||||||||
 | ||||||||||||||||||||||||
| ||||||||||||||||||||||||
| ||||||||||||||||||||||||
2004/03/16 오후 7:03 ⓒ 2004 Ohmynews | ||||||||||||||||||||||||
'세상사는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불편을 즐기는 ‘생태형 인간’ (0) | 2004.04.05 |
|---|---|
| 새순이 돋는다, 하담이 눈뜰 때 (0) | 2004.04.05 |
| [단편소설]어느 노부부의 하루 (0) | 2004.04.03 |
| 너는 극장에 얽힌 추억 없니" (0) | 2004.04.03 |
| 맞벌이 하는 딸은 '전쟁 중' (0) | 2004.04.03 |